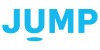점프 ‘장학샘’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청년 4명을 지난 5월2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만났다. 점프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책 읽는 모임을 만들었다. 대학교 4학년 유유리(23)씨는 어릴 때 경험을 다시 나눈다는 생각으로 점프 활동에 참여했다.
“초등학교 때 방과후학교에서 교육 봉사를 하는 대학생 언니·오빠한테 공부를 배웠거든요. 학원은 거의 안 다니고 그때 배운 걸로 대학에 갔어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이들이에요. 봉사 활동 오는 선생님이 자주 바뀌니까 아이들이 빨리 마음을 안 열고, 막 대하기도 하죠. 저는 어릴 때 경험이 있어서 여유 있게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영어 알파벳도 몰랐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유리씨와 1년간 공부한 뒤 활동 수기집에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말을 적은 것을 보고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나눈 만큼 얻은 것도 있다. 점프를 통해 만난 사회인 멘토는 유리씨에게 “인생을 즐기는 법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조언해줬다.
2013년 서울 마포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1년간 장학샘으로 활동하다 지금은 직원으로 점프에 눌러앉은 김재원(27)씨의 경험도 비슷하다. “일주일에 10시간 넘게 아이들과 만나 공부하다보면 고갈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회인 멘토를 만나 고민의 실마리를 얻고 다시 충전됐던 것 같아요.” 점프 장학샘들이 받는 장학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1년에 250만~400만원이다. 과외에 견주면 시간 대비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100명 이상 청년들이 장학샘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사회인 멘토’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 전공자 임현지(24)씨도 사회복지기관, 일반 기업 등에서 일하는 사회인 멘토를 만나면서 진로 고민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가르친 황다은(23)씨는 요즘도 가끔 과자를 사들고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쓰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은 서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모인 센터에서만큼은 누구보다 활달해진다. 가르치려고 아이들을 만났지만, 다은씨는 거꾸로 아이들을 통해 세상 보는 눈이 커지는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출처 및 원문보기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611.html